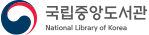추천도서

나는 노비로소이다
- 저/역자
- 임상혁
- 출판사
- 너머북스
- 출판일
- 2010.02.19
- 총페이지
- 264쪽
- 추천자
-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도서안내
우리는 흔히 조선을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 사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조선은 현대 사회 못지 않은 법치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를 둘러싼 ‘노비송(奴婢訟)’과 묘지를 둘러싼 ‘산송(山訟)’이 그리도 많았던 것이다. 지금도 명문가에는 수백 명의 노비를 자손에게 분배하는 상속문서들이 전해져 온다. 이 책은 안동의 명문 학봉 김성일 종택에서 소장한 수많은 고문서 사이에 있던 판결문서가 핵심 모티브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송사는 매우 합리적이고 정교하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다. 현대의 법정 못지않게 원고와 피고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절차 또한 심급제를 통해 오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다른 곳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관할과 상피’ 제도도 있었다. 법관의 자의가 개재할 여지를 최대한 줄인 것이다. 저자는 노비제가 조선시대의 신분제, 나아가 사회의 얼개를 규명하는 핵심 관건이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노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략하다. 저자는 “신분이라는 것이 지극히 법률적인 개념인데도 노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거의 외면한 채 진행된 것은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소송에서도 소송능력이 양반이나 상민과 구별 없이 인정되어, 자신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상전의 소송을 대송하는 등 소송대리권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로마의 노예가 자신의 소송은 물론 타인의 소송조차 수행할 수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노비의 성격을 달리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달랐던 조선의 노비소송을 들여다보면 조선의 시스템이 보이는 듯하다. 이 책은 노비 소송을 통해서 바라본 조선 사회의 생생한 속살이라고 할 수 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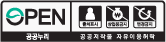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나는 노비로소이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