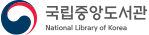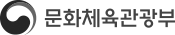추천도서

먼 곳
- 저/역자
- 문태준
- 출판사
- 창비
- 출판일
- 2012. 2. 27
- 총페이지
- 99쪽
- 추천자
- 김미현(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도서안내
1990년대 탈서정의 시대를 겪은 이후 2000년대 새롭게 발견 혹은 발명된 서정의 귀환을 대표하는 시인 문태준의 다섯 번째 시집 『먼 곳』은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처럼 “헤아려 내다볼 수 없는 곳”(「먼 곳」)에 대한 아련함과 서글픔으로 채워져 있다. ‘먼 곳’은 “나를 조금조금 밀어내며”(「먼 곳」) 생겨나는 공간이다. 그래서 ‘먼 곳’은 ‘비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흘러가는 곳’이기도 하다. 무릇 “일생(一生)은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에 다름 아니라면, 죽음은 또 하나의 ‘객지’가 저무는 일에 불과하며 근심은 새로운 근심에 의해서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망인(亡人) 아니면 행인(行人)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모든 인간의 죽음을 향한 움직임은 삶의 빈 곳을 흘러넘치게 할 수도 있다. 비어 있지 않으면 흘러갈 수 없고, 흘러가야만 다시 비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쌓은 것을 오후에 허물었지요/슬픔에 붙들렸으나 숭고한 일일이었어요”(「일일2-숭고한 일」)라거나 “출렁출렁한 한 양동이의 물/아직은 이 좋은 징조를 갖고 있다”(「아침」)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밀어내서 생긴 ‘먼 곳’을 위해 다시 “뭐든 돋아 내밀 듯이 돋아 내밀 듯이 살아가자”(「사무친 말」)고 시인이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색(暮色)이 모색(摸索)이 되는 경지가 이 때 가능해진다. 시인은 티베트 노스님처럼 ‘평정(平靜)’을 중시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오래 생각하고, 자연의 반복을 많이 기억한다. 그래야만 소란스럽거나 강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인의 마음가짐을 닮아 다음 대목처럼 봄날을 맞을 일이다. “모스크바 거리에는 꽃집이 유난히 많았다/스물네 시간 꽃을 판다고 했다/꽃집마다 ‘꽃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나는 간단하고 순한 간판이 마음에 들었다/‘꽃들’이라는 말의 둘레라면/세상의 어떤 꽃인들 피지 못하겠는가.”(「꽃들」) ‘꽃’이 아닌 ‘꽃들’처럼 간단하고 순하게 살기가 사실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이 시집은 낮은 목소리로 전해준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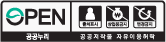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먼 곳"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