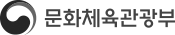문화예술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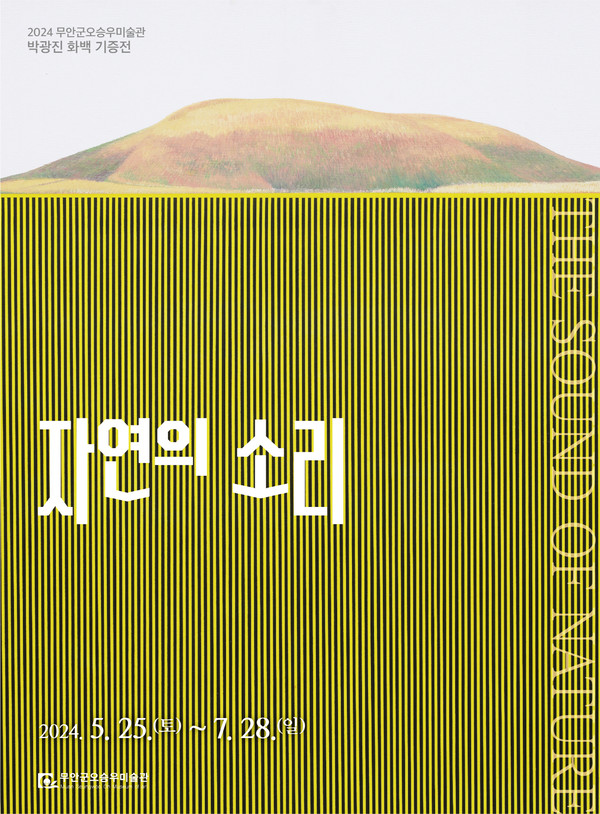
2024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박광진 화백 기증전 <자연의 소리>
- 분야
- 전시
- 기간
- 2024.05.25.~2024.07.28.
- 시간
- 화-일 09:00-17:30 / 월요일 휴관
- 장소
- 전남 | 무안군오승우미술관
- 요금
- 무료
- 문의
- 무안군오승우미술관 061-450-5481~3
- 바로가기
- https://www.muan.go.kr/museum/exhibition/project/schedule?idx=15182421&category_1=%EC%A0%84%EC%8B%9C&mode=view
전시소개
<박광진 화백의 작품세계>
자연의 화음과 조형적 내재율의 공간
박광진 화백의 그림은 자연에 대한 외경심과 찬탄의 심적 상태에서도 감정적 동요나 이입을 자제하며 오롯이 그 내재적 질서에 의한 천변만화에 집중하고 있다. 유형무형, 형상과 비형상의 생명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자연 앞에서 뭇 생명들의 존재와 호흡을 적요의 공간으로 옮겨 냈다. 대체로 자연에 대한 주관적 현장 감흥이나 필촉의 표현성을 살린 회화 묘법으로 화면에 생기를 돋우는 남도 화풍에 비하면 박 화백의 그림들은 사실에 충실한 절제와 침잠의 세계이다. 자연의 평온과 심적 평안을 연결하는 박 화백만의 자연관조 방식인 셈이다. 고요 속에 생명의 흐름이 우러나는 그야말로 정중동의 세계다.
/ 부침하는 시대문화 대신 견고한 사실 탐구
박광진 화백의 그림들은 한국 근대미술의 아카데미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화면의 구성도, 필법도, 색채도, 회화적 표현의 자유로움과 즉흥을 발산하기보다 대상을 임의로 크게 비틀지 않는 차분한 사실묘법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박 화백의 화단 입문기인 1950년대 중후반은 일제강점기 서양화 유입 이래 정형화되어 온 근대적 아카데미즘을 걷어내고 새롭게 동시대 미술로 전환하려는 대변혁의 현대미술운동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당대 화단의 주된 풍토나 신기류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박 화백의 화폭들은 작가의 회화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다. 당시 한국 현대미술로의 전환기에 뒤늦게 모더니즘으로 확산되던 주관적 상상력이나 조형성 위주의 추상 비구상 회화 쪽도 아니고, 시대 상황에 차오른 청년의 도전 의지를 격렬히 분출시키는 광폭한 행위적인 작화방식도 아닌, 자연소재나 정물 인물을 차분히 묘사하는 사실주의 화풍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객관 대상의 외적 형상과 실재성을 우선하는 사실 묘사 위주의 회화적 성향은 화백의 왕성한 사회활동 시기는 물론 노년에 구상 풍경에 추상적 화면 구성을 결합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작품세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특성이다.
/ 절제된 사실 묘사로 찾는 자연풍경의 평온감
세상의 그 많은 그림 소재나 주제 가운데 화가가 무엇을 택하고 어떤 형식으로 다루는가는 그 작가의 고유한 관점이고 개성 있는 회화세계의 밑바탕이다. 생명 없는 기물도 그렇지만 박화백의 풍경화들은 광활히 펼쳐진 들녘의 뭇 생명들을 한 화폭에 모으는 경우와, 시야를 좁혀 그 들녘의 한 무리 억새나 잡풀의 살랑임에 집중하는 경우, 너른 자연 풍경을 화폭의 일부 한 단으로 압축하고 나머지는 여백과도 같은 넓은 밀집선들의 추상공간으로 결합시키는 구성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박광진 화백의 밝은 햇살 아래 찬연히 빛나는 자연 풍경화들은 1960~70년대 작품들에서 크게 차지하던 산의 비중이 점차 멀고 작게 원경으로 둘러지고 대신 들녘이 더 넓게 화폭을 채우는 흐름을 볼 수 있다. 1975년의 <제주 윗새오름>은 화면의 삼 분할 정도로 오름 봉우리가 크고 가까이 묘사되고, <사기동 설경>(1972), <설악 단풍>(1976), <설악의 눈>(1976), <무등산 겨울>(1981)에서도 산이 주제가 되어 화면을 채우고 있다.
<제주의 유채들>(1992), <제주 억새길 오름>(1997), <억새들>(2008), <민둥산 억새>(2008) 등은 박화백이 특별히 제주의 풍광에 매혹되면서 꼼꼼한 세필들로 너른 억새 들녘 풍경을 화폭에 담은 작품들에 해당한다. 촘촘한 붓자욱들이 모여 풍경의 군집들을 만들고, 다른 경물들을 함께 억새를 주제로 삼음으로써 바람결과 바람소리까지 청음효과를 중첩시켜내고 있다. 이들 억새 풍경들은 <억새 냇가>(2008)처럼 수직의 가느다란 선들이 강변의 억새 숲을 이루고 있고 모래밭의 크고 작은 돌맹이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덩어리감을 묘사하고 있어 일반적 가벼운 붓터치의 풍경화들과는 다른 비현실적 몽환경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 구상적 자연풍광과 비구상적 내재율의 추상화면 결합
자연풍경을 이루는 여러 요소를 한 덩이 넓은 색면공간으로 묶는 박광진 화백의 화면 구성상의 대상에 대한 해석은 1990년대 말부터 전혀 새로운 회화세계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즐겨 다뤄오던 밝게 빛나는 풍경이며, 생기 넘치는 색채의 유채밭이며, 바람결에 흔들리는 억새무리 등을 화폭의 일부 단으로 압축하고 나머지 면을 가느다란 밀집선들로 채운 넓은 추상공간으로 처리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인다. 수많은 생명존재들이 펼치는 조화로운 세계로부터 교감해 온 자연의 색채와 소리, 보이지 않는 조화와 공생의 질서를 독자적인 조형적 변주로 풀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수시로 마주하는 제주 억새들에서 가늘고 기다란 줄기의 밀집선들을 엄연한 내적 질서를 지닌 자연 생명의 이미지로 추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수평의 띠처럼 압축시킨 풍경과 그 위아래로 교차하는 치밀한 수직 밀집선들은 화면에 견고한 시각적 질서와 함께 음이 소거된 적요의 공간이면서도 오히려 미묘한 생명의 화음으로서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객관 대상으로서 풍경을 대하는 교감과 절제된 표현이 내적 심상으로 추상화되고 그로부터 현상과 상상이 겹쳐지는 또 다른 세계의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자연의 비가시적 질서의 조형화
박광진 화백의 화폭은 뭇 자연 생명들의 군집이 빚어내는 거시적 무한성과 함께 그 내밀한 내재율의 질서에 대한 감응으로서 회화다. 자연의 풍경이 주된 소재 대상으로 전제되긴 하지만 그 가시적 형상에서 점차 공간감이나 색채가 주가 되고, 마침내 자연을 하나의 상징체로 간결하게 압축하며 비가시적 질서를 조형화시켜내는 서로 다른 차원의 중첩작업인 셈이다.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그로부터 생명의 소리를 드러내는 조형의 세계이고, 구상과 비구상의 합체, 외경과 내면의 결합, 긴장과 이완의 공존으로서 화면공간은 작가의 엄격한 자기관리의 삶과 화업 태도를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술 문화계에서의 숱한 바깥 활동들 가운데서도 구상미술의 전형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꾸준한 정진과 더불어 완숙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이를 또 다른 차원으로 전격 치환시켜내는 과감한 변주를 통해 독자적 회화세계를 펼쳐내고 있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박광진 기증전, <자연의 소리> 서문 중에서 발췌편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주
아주 기대
기대 보통
보통 분발해
분발해 실망
실망